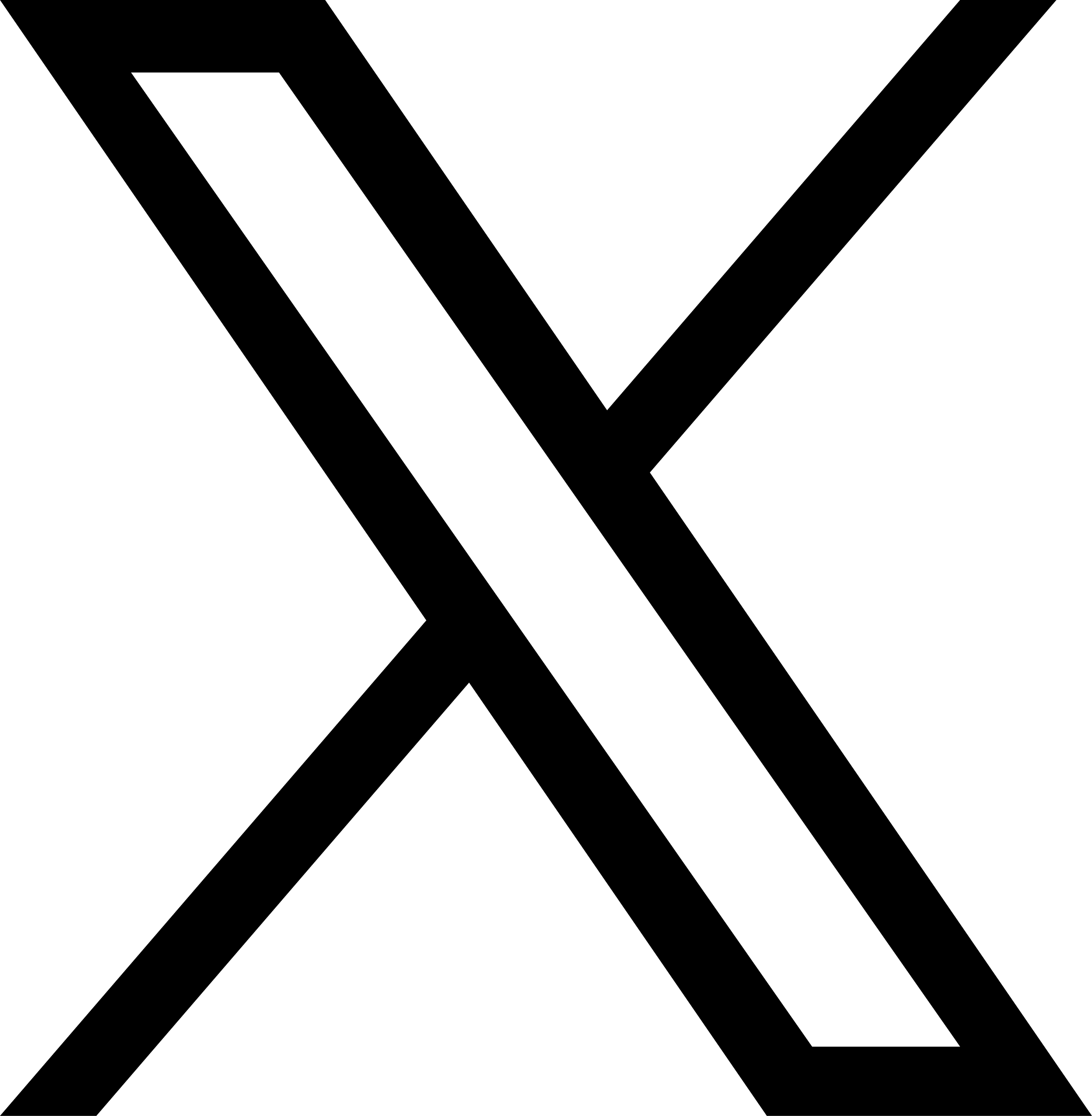수필묶음 《삶의 이야기》 그림
2018년 04월 24일 14:28 주요뉴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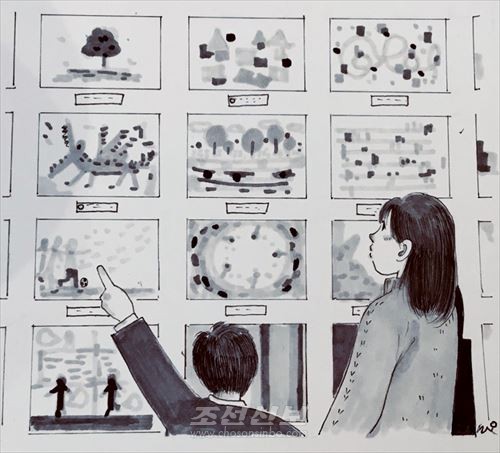
그림-박미오(니시도꾜제2초중 교원)
은별이/리우자
벌써 30년전의 추억이다. 1989년 여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열린 평양에서 나는 《총련전시관》 설치와 해설 역할을 맡아 일했다. 전시관은 대동강반 청년회관의 2층에 자리잡았다.
같은 2층 홀의 열린 마당에서 천재화가라 불리우던 오은별꼬마가 그림실기를 피로하고있었다. 조그만 체구, 작은 손에 굵직한 붓을 들고 조선화를 그려내는 9살 소녀의 주변에는 련일 국내외 많은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그림 솜씨는 도저히 아이 같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애교하나 부릴줄 모르는 그의 모습은 어린아이 그대로였다. 처음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던 우리였지만 참관객들이 없는 시간에 몇번 찾아가 조금씩 말도 나누는 과정에 점점 가까워졌다.
《은별아》, 《아지미》-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간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웃으며 수다도 떨게 되였다. 지낼수록 어린이답고 귀엽게 여겨졌다.
어느날, 같이 놀다가 종이를 펼쳐놓고 은별이가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자기가 살고싶은 집을 그려보자요.》
천재화가가 어떤 집을 그릴가? 나는 흥미진진했다. 연필을 쥔 은별이는 사랑스럽게 재잘거리면서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아빠, 엄마, 나랑 동생이 사는 집이고요…》
그는 종이 반쪽에 작은 단층집을 그렸다.
《그리고 여기에는 염소들이 있고 닭과 오리도 많이 길러요. 이쪽에는 남새를 심고 꽃도 심고…》
은별이가 종이우에 빼곡이 그려놓은 리상의 집!
참으로 놀라웠다. 솔직히 나는 그가 미래적인 고층집을 그릴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은별이가 마음속에 그리는 행복의 모습, 그의 풍요롭고 싱싱한 샘물과도 같은 감성에 나의 얄팍했던 상상력은 완전히 뒤집혔다.
맑고 천진란만했던 그날의 은별이 모습은 축전에 들끓었던 그해 여름 조국의 모습과 함께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효고현 히메지시 거주)
늘 곁에/리유실
내가 난생처음으로 화집을 손에 든것은 중급부생이였을 때다. 뜻하지 않은 사고때문에 몸이 불편해진 저자가 화집에 수록된 모든 그림을 입에 붓을 물어 그려내였다는데 깊은 감명을 받아서였다.
《겨울이 있고/여름이 있고/낮과 밤이 있고/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있어/한송이의 꽃이 피는것처럼/슬픔도 괴로움도 있어/내가 나로 되여간다》
새하얀 종이에 물감이 스며들듯이 시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곱게 물들여가는것만 같았다.
한포기 꽃그림에 씌여진 그 시는 한창 민감한 시기였던 나에게 잠간의 위로와 휴식을 주었다.
대학에서 《시는 한폭의 그림》처럼 써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 그 무슨 그림을 볼 때마다 거기에 담겨진 작가의 말을 생각하고 시를 쓸적에는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보군 했다. 그러는 과정에 그림은 나에게 더 친숙한것으로 되여갔다.
교원이 된 후 집안에 초상이 나서 며칠동안 집에서 지냈다가 학교로 돌아온 날에 있은 일이다.
교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치마저고리를 입고 활짝 웃는 나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글발이 함께 씌여져있었다.
안 보는 동안에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 나어린 아이들의 정성이 고마웠고 내가 주어야 할것을 먼저 준 그들이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것이 새로운 즐거움으로 되였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이 주는 그림들은 꼭꼭 책상우에 놓고 감상하는것을 재미로 삼았으며 해마다 열리는 미술전람회는 지금도 기다려지는 행사중의 하나가 되였다.
나에게 그림은 삶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실인가보다.
앞으로도 생활의 토막토막에서 크고작은 고통을 겪게 될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나도 이 펜을 들고 글로 표현하고싶다.
(조선문제연구쎈터 직원)
그림책을 찾는 아이들/리호연
막내딸이 보육원을 졸원했다. 둘째아들과 막내딸이 계 11년간 다닌 보육원에 아침저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지니 좀 섭섭하기도 하다.
나자신이 40여년전에 다녔던 보육원이기도 하니 더더욱 감회가 깊다.
졸원식에서는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임이 끝나고 퇴장할 때는 재원생이며 교직원들과 손을 맞대며 흐느껴우는것이다. 우리 내외도 감동하여 함께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 어린 나이에 작별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그렇게도 우러나오는것인가. 얼마나 동무들이 좋아서, 6년간 다닌 보육원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것일가.
이곳 보육원으로 말하면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동물이랑 벌레들이랑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 《야생아들이 자라나는 보육원》이다.
애들은 평소에 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여 놀고 여름철이면 까맣게 해볕에 탄다. 정서교육의 일환으로서 옛이야기나 동화들을 년간을 통해 접하게 된다.
보육원에서 하는 놀기도, 산보도, 급식도, 낮잠도, 그림그리기도, 노래부르기도 다 좋지만 그중 딸이 무엇보다 좋아하던것이 그림책이였다. 어느 보육원에서나 그렇겠지만 그림책을 읽기 전에 보육사들이 아이들을 집중시켜놓고 옷안에 숨겨놓은 책을 꺼내여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배여 어느새 우리 딸도 자기가 보육사가 된것처럼 동무들이랑 동생들에게 재미나게 들려주군 했었다.
이곳 보육원은 도서고도 갖추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림책을 대출하고있다.
물론 첫시기는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빌리군 하는데 2〜3살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그림책을 고르기 시작한다. 2, 3주 련속적으로 같은 책을 빌리는것도 흔한 일로 되고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좀 바빠도 목요일이면 딸과 함께 꼭꼭 도서고를 찾는것이 습관이 되고있었다.
그런 추억들이 가득찬 보육원을 떠나면서 부모회에서는 앞으로도 동생들이 계속 정서를 키워나가기를 바라며 그림책을 선물하였다. 우리 딸이 그러하던것처럼…
(회사원)